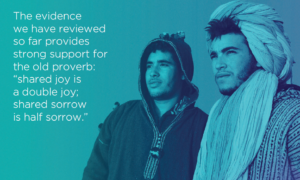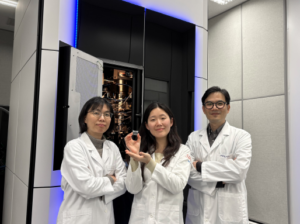『2025 세계 행복 보고서』가 말하는 청년고립과 정서적 연결의 위기
행복한 사회란, 청년이 고립되지 않는 사회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청년들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는다. 청년고립이라는 현실 속에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2025 세계 행복 보고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정제된 수치로 제시하지만, 그 숫자 이면에 놓인 외로움의 진실은 훨씬 더 깊고 무겁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청년(18~29세)의 19%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무려 39% 증가한 수치다. 이 통계는 단순한 정서적 불편을 넘어, 우리가 한 세대 전체의 신호를 놓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청년들은 ‘연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 더 많이 접속되어 있지만, 더 적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이들의 침묵은 사회 전체가 귀 기울여야 할 조용한 신호다.
외로운 청춘 – 숫자로 드러난 고립의 얼굴
『세계 행복 보고서』는 매년 세계 각국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세계적 신뢰도를 지닌 보고서다. 그중 2025년판에서는 청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고통에 유난히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청년 응답자들의 고립감 관련 지표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이 응답은 단순한 관계 결핍이 아니다. 이는 정서적 안전망의 부재를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의 결핍을 반영한다. 보고서는 이 수치를 “worrisome rise”라고 표현하며, 지속적이고 세계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고립감이 지역을 초월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북미와 동아시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중산층 국가들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물리적 독립과 정서적 고립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청년들이 ‘혼자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혼밥과 혼자의 밤 – 일상의 단절이 만들어내는 정서의 침식
청년 고립의 현실은 보고서 곳곳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중 하나는 식사 습관이다. 보고서는 2023년 미국 기준으로 25세 이하 청년 중 하루 세 끼 모두 혼자 먹는 비율이 26%에 달하며, 이는 2003년에 비해 무려 53% 증가한 수치라고 밝힌다. 혼밥은 단순한 생활습관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가 삶의 리듬을 지배하고 있다는 지표다.
보고서는 Gallup의 조사 데이터를 인용해, 함께 식사하는 빈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강조한다.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할수록 긍정적 감정은 높아지고, 부정적 감정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 효과는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사람과의 식사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연결의 부재가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자기해에 대한 충동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those who report having no one to rely on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experience emotional distress, lower satisfaction and health problems”라고 명시한다. 고립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정서적 리스크다.

Z세대는 왜 더 외로운가 – 디지털 세대의 역설
보고서는 Z세대가 경험하는 고립을 단지 관계망의 축소로만 보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관계의 질적 변화라는 구조적 전환의 결과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한 Z세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만큼 깊은 관계에 대한 갈망과 결핍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비교와 과잉 노출, 감정의 소비를 낳았다. 보고서는 “청년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연결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신뢰 기반의 관계는 줄어들었다”고 분석한다. 즉, ‘좋아요’는 많지만 ‘진짜 대화’는 없는 사회다.
또한 사회적 경쟁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끊임없이 선택받기 위한 존재로 살아간다. 친구, 연인, 직장,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조건화된 인정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정서적 피로와 회피적 애착 방식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정서는 관계의 깊이를 제한하며, 청년 고립의 심화로 이어진다.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 연결을 가로막는 구조들
보고서는 청년 고립을 사회적 구조의 결과로 본다.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연결을 지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경고다.
대표적인 예가 주거 문제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가 삶의 자율성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한다. 주거 불안, 사회적 인프라의 부재, 지역 커뮤니티의 와해는 청년들이 물리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큰 불안정 속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
또한 공교육과 고등교육 체계는 여전히 성과 중심의 경쟁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또래 간 협력보다는 분리와 서열화를 강화한다. 고립은 대개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러한 구조는 누구에게나 연결 단절을 일상화시킨다.
돌봄의 회복 – 청년 연결을 위한 사회적 상상력
보고서는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으로 돌봄(caring)의 사회화를 제안한다. 이는 단지 복지를 확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정서적 연결을 존중하고, 이를 정책과 문화 속에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는 ‘공공적 연결 경험’의 확대다. 식사 공유, 지역 기반 활동, 세대 간 교류, 또래 멘토링 등은 고립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다. 보고서는 특히 의미 있는 관계는 반드시 혈연이나 친밀한 친구 관계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며, 공공이 이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심리적 지원 인프라 확대가 필수적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 대상 심리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편적 공공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고립을 조기에 감지하고 지원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은 아직 이 영역에서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신뢰의 회복’을 강조한다. 신뢰는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관계는 행복을 가능하게 한다. 신뢰는 타인을 기대하는 감정이며, 이는 제도와 문화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 숫자들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듣는다면
『세계 행복 보고서 2025』는 데이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청년 한 세대가 지금 조용히 외롭다고 말하고 있다. 더는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경고다.
사회는 연결이 끊어진 개인들로는 유지될 수 없다.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며, 특히 청년기에 그 기반이 무너지면 평생에 걸친 회복 비용이 뒤따른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고립은 침묵 속에 다가오고, 사회는 그것을 수치로 보고 있지만, 진심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다.
이제는 청년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건을 바꾸기 위한 정치, 정책, 문화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도시와 학교, 직장과 가정이 더 많은 연결을 품을 수 있도록, 청년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세계행복보고서2025 #청년고립 #정서적연결 #Z세대외로움 #식사공유 #사회적신뢰 #심리정서복지 #청년정책 #공공돌봄 #공동체회복 #디지털세대의고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