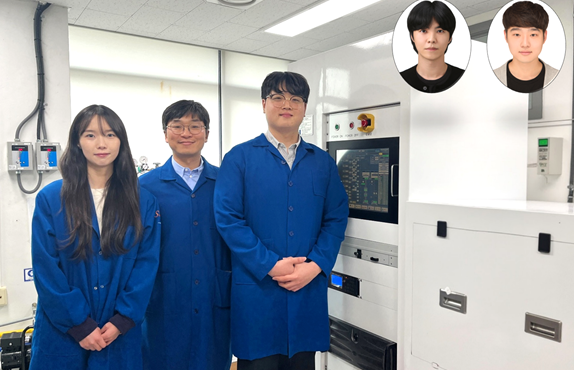미국 고등교육은 한때 계층 이동과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로 여겨졌으나, 오늘날 그 역할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웨슬리언 대학교의 마이클 S. 로스 총장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현재의 고등교육 체제가 가진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논의는 한국 대학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미국 고등교육의 문제점: 불평등의 고착화
미국의 엘리트 대학은 과거에는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상류층의 특권을 더욱 강화하는 구조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 총장은 상위 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입시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하위 20% 소득층의 학생들은 선택적 대학에서 5% 미만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특히, 부유한 가정은 자녀들에게 고급 사교육, 방학 프로그램, 과외 등을 제공하며 “성공을 위한 경로”를 만들어 줍니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이로 인해 고등교육은 더 이상 평등의 상징이 아니라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개선 방향: 포괄적 교육 기회의 확대
로스 총장은 엘리트 대학들이 기존의 입학 기준을 넘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비영리 단체 National Education Equity Lab과 같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고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열어주는지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고등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학생이 엘리트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대학 입학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적인 교육 경로(예: 직업학교, 견습 프로그램, 2년제 대학)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대학교육에 주는 시사점
미국 고등교육의 문제는 한국 대학교육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국 역시 대입 과정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 중심의 입시 경쟁은 지방 학생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고등교육이 계층 이동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포괄적 입시 제도 도입: 학생들의 잠재력과 배경을 고려한 입시 제도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 대학 간 균형 발전: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 대학으로 분산하여 교육 기회를 지역적으로 평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안적 교육 경로 강화: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시스템을 강화하여 대학 진학 외에도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로스 총장은 “헌법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태어난 계층에 갇혀 있는 상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교육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임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한국도 고등교육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출발선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고등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