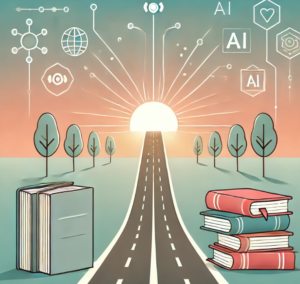문제는 있지만 탄핵 사유엔 미치지 못해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사 최초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4:4의 의견으로 심판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재적위원 2인만으로 이루어진 의결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직무상 책임이 논의의 중심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다수의 의견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정당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중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사건 개요: 재적위원 2인의 의결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024년 7월 31일, 임명된 당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제34차 회의)를 소집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총 5명의 위원 중 3명의 자리가 공석인 상태였으며, 재적위원 2인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안건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러한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 과반수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이를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4:4 의견으로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의견(4명)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 요건에 대해, 당시 방통위의 재적위원은 실제 소속된 2명뿐이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방통위법이 의결정족수는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정족수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최소 의결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았다.
인용의견(4명)
반면,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적법한 의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원 5명이 모두 임명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며,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기각의견 보충: 문제는 있지만 탄핵까지는 과하지 않다
재판관 김형두는 보충의견을 통해 “재적위원 2인 의결이 법적 이상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탄핵까지 이어질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피청구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하거나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사안은 국회와 법원의 감시·통제라는 기존 권력분립 원칙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용의견 보충: 의결 정당성 훼손
재판관 정정미와 정계선은 보충의견에서 “방통위의 운영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손상된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의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이 임명 당일 재적위원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것은 법적·정치적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방통위의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탄핵은 기각됐지만, 방통위 운영에 중대한 질문 남겨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는 피했지만, 방통위의 법적 운영 방식과 합의제 기구로서의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을 남겼다. 방통위법은 원칙적으로 5인의 상임위원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원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2인 체제라는 불안정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강조했듯,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방통위의 합의제 원칙을 유지하려면, 방통위 구성의 안정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와 대통령이 방통위 위원을 신속히 임명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방통위법의 불명확한 조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구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논란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공적 논의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